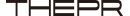언론사들에게 네이버는 달콤한 독배다. 엄청난 방문자를 끌어다 주지만 그만큼 치러야할 대가도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소속된 언론사들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이 절반 이상의 온라인 트래픽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문자의 90% 이상이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언론사도 많았다. 네이버가 갑자기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온라인 독자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광고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언론사들에게 네이버는 달콤한 독배다. 엄청난 방문자를 끌어다 주지만 그만큼 치러야할 대가도 크기 때문이다. 미디어오늘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네이버 뉴스캐스트에 소속된 언론사들 트래픽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이 절반 이상의 온라인 트래픽을 네이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방문자의 90% 이상이 네이버에서 유입되는 언론사도 많았다. 네이버가 갑자기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중단하기라도 한다면 온라인 독자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다. 당연히 광고 수입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네이버 첫 화면에서 언론사 뉴스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상당한 트래픽을 언론사들에 몰아주고 있는 셈인데 덕분에 독점 논란이나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 덕분에 언론사들은 엄청난 트래픽 폭탄을 맞게 됐고 광고 수입도 크게 늘어났다. 대형 포털과 언론의 기묘한 공생관계가 시작된 셈이다. 언론사들은 그동안 포털 사이트에 헐값에 뉴스 콘텐츠를 판매하면서 불만을 터뜨려왔다. 날마다 생산하는 모든 기사를 네이버에 넘겨주고 받는 돈은 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정도. 억 단위로 받는 곳은 몇 군데 안 된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독자들이 포털에서 뉴스를 읽기 시작하면서 개별 언론사 사이트의 방문자가 급감했고 언론사의 영향력도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다.
대형 포털-언론간 기묘한 공생
이런 맥락에서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나눠주는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캐스트 이후 언론사들이 네이버 덕분에 얻게 되는 광고 수입은 적게는 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대에 이른다. 15년 전 포털 사이트가 처음 생겨서 뉴스 콘텐츠를 사들이기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관계가 역전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언론사들이 포털을 키웠는데 이제는 언론사들이 포털의 영향력에 기생하는 신세가 됐다. 포털 사이트 가운데서도 네이버의 점유율은 압도적이다. 방문자 수는 월간 3천만명을 웃돌고 페이지뷰는 월간 250억건, 검색 쿼리 점유율은 지난해 말 기준 67.64%에 이른다. 웹 브라우저의 시작 페이지 점유율도 51.4%로 압도적인 1위다. 인터넷 이용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네이버로 인터넷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다.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걸리는 자리는 네이버에서도 가장 주목도가 높고 많은 클릭을 유발하는 자리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다. 뉴스캐스트에서 뉴스를 읽는 독자들은 더 이상 뉴스를 브랜드로 소비하지 않는다. 뉴스는 이제 낱개로, 철저하게 개별 콘텐츠 단위로 소비된다. 조선일보나 한겨레의 기사를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제목만 보고 끌리는 링크를 클릭하게 된다. 그게 중앙일보 기사인지 경향신문의 기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뉴스캐스트가 만든 달라진 뉴스 소비 행태다. 뉴스캐스트에 대한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건 기사 페이지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지저분한 광고들이다. 특히 임플란트나 비뇨기과, 성형외과 광고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기사를 덮고 있는 플로팅 광고도 많은데 클릭을 해도 창이 닫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이버 옴부즈맨 페이지에는 언론사 사이트로 보내지 말고 옛날처럼 그냥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게 해달라는 불만 또는 항의가 자주 올라온다.
주목할 부분은 전체적으로 페이지 뷰가 크게 늘어난 반면 열독률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사실이다. 1회 방문 당 페이지뷰가 2008년 5.3건에서 2009년에는 3.7건으로, 지난해는 3.5건으로 줄어들었다. 체류 시간은 201초에서 164초로, 지난해에 149초까지 줄어들었다. 상당수 독자들이 네이버 뉴스캐스트를 타고 들어왔다가 기사 한 건만 읽고 바로 창을 닫아 버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 어뷰징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섹시하고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어야 더 많은 방문자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더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포츠·연예 매체들이 좀 더 심하긴 하지만 조중동이나 한겨레, 경향 등 모든 언론이 마찬가지다. 어떤 제목을 내거느냐에 따라 달마다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더 버느냐 덜 버느냐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점잖은 척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연예·가십성 기사가 크게 늘어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기 검색어가 뜨면 잽싸게 베껴다가 비슷비슷한 기사를 쏟아내기도 하고 연예인 미니 홈피나 트위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을 놓고 5분 만에 기사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좋은 기사를 쓰는 것도 좋지만 잘 팔리는 기사를 써야 더 많은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준 높은 분석 기사와 탐사보도 기사보다는 걸 그룹의 허벅지 이야기가 더 잘 팔리는 것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네이버가 언론을 망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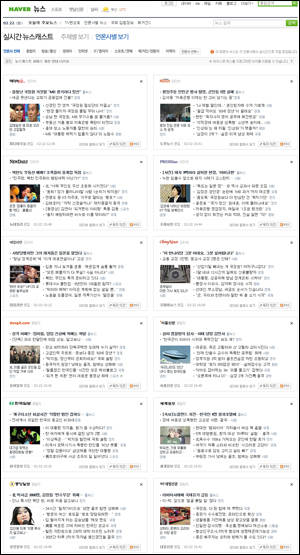 당연히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 독자들은 이제 어느 신문 1면에 뭐가 났는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뉴스캐스트 가운데서도 톱 기사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은 아예 연예 관련 기사를 버젓이 톱 기사에 올려놓기도 한다. 아무리 중요한 기사라도 트래픽이 안 나오면 뉴스캐스트에 올라가지 못한다. 같은 기사라도 이왕이면 좀 더 눈길을 끄는 제목을 내걸어야 한다. 이 정도면 네이버가 언론을 망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도 일부 있지만 이미 독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은 즉흥적이고 파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독자들은 이제 진지하고 골치 아픈 기사를 읽지 않는다. 누군가의 툭 던지는 한 마디, 솔깃한 이야기거리에 반응한다. 이슈가 실종되고 어젠더는 쉽게 퇴색된다.
당연히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도 크게 약화됐다. 독자들은 이제 어느 신문 1면에 뭐가 났는지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뉴스캐스트 가운데서도 톱 기사가 가장 많은 트래픽을 불러들이기 때문에 일부 언론사들은 아예 연예 관련 기사를 버젓이 톱 기사에 올려놓기도 한다. 아무리 중요한 기사라도 트래픽이 안 나오면 뉴스캐스트에 올라가지 못한다. 같은 기사라도 이왕이면 좀 더 눈길을 끄는 제목을 내걸어야 한다. 이 정도면 네이버가 언론을 망치고 있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다. 물론 모든 언론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언론사도 일부 있지만 이미 독자들의 뉴스 소비 패턴은 즉흥적이고 파편화된 양상을 보인다. 독자들은 이제 진지하고 골치 아픈 기사를 읽지 않는다. 누군가의 툭 던지는 한 마디, 솔깃한 이야기거리에 반응한다. 이슈가 실종되고 어젠더는 쉽게 퇴색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은 국내 언론의 열악한 수익모델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초에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를 거부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미 종이신문을 팔아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 종이신문을 만드는 언론사들은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보다는 광고주들과 유착을 통해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했다. 기업들은 광고 효과도 없는 신문들에 적당히 광고를 나눠준다. 문제는 그나마도 그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다는 데 있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가 달콤한 독배라는 걸 알지만 이를 거부할 다른 대안이 없다. 당장 네이버를 끊으면 독자가 반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데다 연간 수십억원의 광고 수입을 고스란히 날려야 한다. 뜨내기 독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나마도 없는 것보다 낫다. 네이버 없이 자생할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언론사가 몇이나 될까. 네이버를 끊는 순간 마이너 매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한국 언론의 현실이다. 한동안 네이버와 언론의 공생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굳이 뉴스캐스트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언론사들은 이미 네이버 없이는 자체 생존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지만 중이 제 머리를 깎기는 어려운 법.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독자들의 불만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새로운 언론에 대한 욕구도 그에 비례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한 뉴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주류 언론의 어젠더 셋팅 기능이 약화되고 불신이 확산되면서 소셜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넘겨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좋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 못지않게 새로운 시스템에 맞은 새로운 유통 채널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네이버 뉴스캐스트는 강력하지만 낡고 촌스러운 채널이다. 머지 않아 그 대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