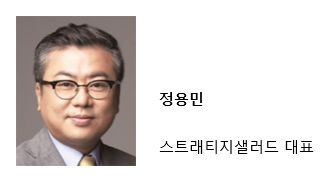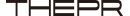[더피알=정용민] 중국 전한(前漢) 시대의 책 <회남자(淮南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못에서 물고기를 보고 부러워하느니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게 낫다(臨淵羨魚不如退而結網).’ 학생이나 직장인 누구에게나 큰 교훈을 주는 말이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도 있다. 요즘 유행하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는 말과도 연결된다. 그러지 말고 빨리 그 떡을 가지기 위해 움직이라는 의미다.

기업 위기관리에서도 이 ‘회남자’의 명언은 의미가 있다. 새해가 밝아 오니 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저기 문제들이 생겨난다. 멀쩡한 회사들이 위기를 맞아 어쩔 줄 모르고 비틀거린다. 빠르게 대처는 했지만 그 효과가 나지 않으니 마구 덧칠 대응을 해 화를 키우는 곳들도 보인다. 초기 타이밍을 잘 잡아 커뮤니케이션 했는데, 그 메시지가 당황스러운 것이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문제가 된 회사도 있다.
제3자 입장에서 그 회사들을 평소 좋게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떻게 저런 회사가 지금까지 그리 승승장구해 왔을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좀 이상한 회사였네.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니 알겠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성공한 회사라면 아무리 문제가 크다고 해도 무언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막연히 믿고 있는 것 같다. 일종의 기대감이다.
기업 차원에서는 속이 끓는다. 외부에서 거는 기대는 큰 반면 사실 내부에서 들여다보는 자신들의 준비상태나 체계는 별반 내세울 것이 없으니 그렇다. 매출은 수천억에서 수조를 지향하는데 내부 위기관리 체계는 아주 창피한 수준인 곳들이 꽤 된다. 무언가 준비와 체계가 있어야 외부의 그 기대감을 일부라도 충족시키는데, 그 조차 힘든 상태인 것이다.
안과 바깥의 인식 차이
실무자들에게 “왜 이렇게 큰 회사에서 위기관리 체계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을까요?” 물어보자. 수많은 하소연들이 나온다. 매번 유사한 해프닝들이 내부에서 반복된다 한다. 사일로(회사 안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가 강한 조직이라 협업은커녕 지휘도 힘들다 한다.
CEO가 위기 때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불평도 나온다. 조직 구성원들 스스로가 관심이 없다는 지적도 한다. 관행이나 지시사항들이 많아 문제 소지들이 제거되지 않으니 우리가 별 수 있느냐는 탄식도 종종 나온다. 회사 내부로 무엇이 미처 안 돼 있다면 당연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다양하고 광범위한 이유와 변명이 나오는 분야가 또 있나 싶다.

그러면서 실무자들이 묻는 질문이 꼭 있다. “어디가 좀 잘하나요? “OO회사는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떤가요?” “이번에 거기 그 회사가 위기관리를 좀 잘 한 것 같은데, 그쪽 체계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아세요?”
질문의 목적을 더 들어보면 이렇다. 잘하고 잘되는 기업들의 위기관리 체계들을 벤치마킹해서 경영진들을 설득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일부는 자신들도 어떤 게 잘된 체계인지를 좀 알아야 그걸 흉내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내심 이런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무언가 해내고 싶은 열정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여러 회사의 위기관리 체계를 ‘보고 배우기만’ 하는 회사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회사 위기관리 매뉴얼을 여러 개 구해 그걸 보유하고 있는 실무자들도 만나 봤다. 사실 기업 위기관리 매뉴얼은 공식적으로 대외비인데 제3자가 어떻게 구해서 자랑하고 있는지 당황스럽다.
심지어 경쟁사 매뉴얼까지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그걸 모두 모아 놓고 있는 것은 좋은데, 막상 그 회사의 위기관리 체계는 십 년 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실무자가 공부만 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든다. “타사 위기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 학습이지만, 자사에 구현시키는 것은 정치력이 수반돼야 해 어렵다”며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들었다. 좋다.
잘 된 회사가 잘 한다
중국 고사들을 인용했으니 하나 더 해보자. 우리가 잘 아는 병법서 ‘손자병법’의 그 유명한 문장들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 위기관리에서 이 보다 더 정확히 기업이 행해야 할 방향성을 기술한 말이 드물다.
여기서 ‘적(enemy)’이라면 우리 회사에게 다가올 부정적 이슈나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와 관련돼 있는 주요 ‘이해관계자(stakeholders)’를 알고 있다는 의미와도 통한다. 반면 ‘나(myself)’라는 의미는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회사의 위기관리 준비상태와 체계를 뜻한다. 의사결정자들의 위기관리 리더십 역량과 일선 실무자 그룹들의 실행 역량, 예산, 관제 체계 등도 동시에 일컫는다.
즉, 위기관리의 ‘우수성 이론’이랄 수도 있는 ‘위기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해 잘 준비해 좋은 체계를 가진 회사가 결국 위기관리도 잘한다’는 의미다. 잘 된 회사가 잘 한다. 아주 간단한 이론(?)이다. 이론은 간단해 보이는데 현실은 참 힘들고 복잡하다.
손자병법의 그 이후 문장은 또 이렇게 연결된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은 진다(不知彼而知己 一勝一負)’. 이 말의 뜻은 ‘혹시 다가올 이슈나 위기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회사라도, 사내 위기관리 준비나 체계를 어느 정도 키워 놓으면 승률은 반반’이라는 조언이다. 일부 실무자들에게는 약간 힘이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쨌든 내부적인 위기관리 역량은 키워야 한다니 고민은 비슷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문장은 또 이렇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진다(不知彼不知己 每戰必敗)’. 당연한 말이다. 관심이라도 가져야 하는데 그런 관심이 없으니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회사가 혹시 있을까 하는 ‘설마’ 의견이 있기도 한데 정말 있다. 가끔 언론이나 온라인을 통해 우리들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회사들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런 회사들이었다.
잘돼 있는 사례와 회사들을 구경하는 것은 좋다. 위기관리 관점에서 반대로 잘 안돼 있는 회사들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아주 좋은 개선방식이다. ‘지피지기’에 있어 제대로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아주 멋진 일이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자면, ‘못에서 물고기를 보고 부러워하느니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게 낫다(臨淵羨魚不如退而結網)’는 맨 서두의 말이 떠오를 것이다.
올해를 그물 짜는 한 해로 만들어 보자. 더 이상 못에 옹기종기 앉아 물고기를 부러워하고 있을 필요도 없다. 우리회사도 이제 그물을 만들어 제대로 된 위기관리 체계를 한번 잡아 보자. 처음엔 그물이 낯설거나 만들어 보니 성길 수 있다. 하지만 아예 그물을 만지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 작년까지 여러 해 반복적으로 하소연 했던 ‘안 되는 이유들’을 이제는 좀 등지고, 우선 되는 것들로라도 그물을 짜 보자.
회사에 오래 방치된 그물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찾아 손질을 해보자. 여기 저기 뚫리고 좀이 슬어 끊어진 그물이라면 여럿이 둘러 앉아 기워내 사용 가능한 그물로 재탄생시켜보자. 그물을 기우거나 짜본 경험이 없다면 그물장이들을 구하거나 그들에게 배워 한 땀 한 땀 제대로 만들어 보자.
물고기가 부러워 구경하면서 시간 보내는 건 그만하자. 진짜 그 물고기가 탐나고 잡기 원한다면 필히 그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CEO와 전 직원이 공감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아직도 물고기가 가득한 못을 구경만하고 있는 경쟁사들. 그들이 위기와 싸울 때 마다 모두 질 때(每戰必敗), 돌아가 튼튼한 그물을 짜낸 우리는 백 번을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게 돼보자(百戰不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