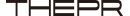[더피알=황부영] 가죽을 한자로 피혁이라고 한다. 피(皮)나 혁(革) 모두 ‘가죽’을 뜻한다. 뭐가 다른 것일까?
혁신을 말 그대로 풀면 이렇다. ‘짐승의 몸에서 갓 벗겨낸 가죽(皮)에서 털과 기름을 제거하고 무두질로 부드럽게 잘 다듬은 가죽(革)을 새롭게 한다(新).’
중국 고전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혁(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獸皮治去其毛 曰 革 革便也(수피치거기모 왈 혁 혁편야).” 즉, ‘짐승의 가죽에서 그 털을 뽑아 다듬은 것을 혁이라 하며 혁은 편한 것이다’라는 뜻으로, 맨가죽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워진 가죽이 혁이란 얘기다.
이 맥락에서 혁신은 ‘면모를 일신하다’ ‘고치다’는 의미가 됐고, ‘묵은 제도나 방식을 새롭게 고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일컫는 말이 됐다.

전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혁신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다. 비연속적 변화를 가져오는 기술혁신을 통해 경제발전이 일어난다는 슘페터(Joseph Schumpeter)의 ‘혁신이론’이 등장한지도 1세기가 지났다.
슘페터는 1912년 ‘경제발전 이론’, 1928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라는 논문에서 경제성장의 외적동인으로 혁신(Innovation)과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들었다. 그 이후 혁신은 기업 활동의 주요 화두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과거와의 단절적 혁신을 뜻하는 ‘창조적 파괴’라는 표현도 익숙해졌지만 기업의 혁신 사례는 오히려 찾기가 쉽지 않다.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언론보도를 보면 지구상에서 혁신은 오로지 ‘애플’만이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에서 혁신을 주창해도 쉽게 실천되지 않는 것은 또 무엇 때문일까? 혁신을 바라보는 좁은 시각 탓이다.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혁신, 그것도 과거와의 단절적 변화를 가져오는 극적인 기술혁신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창조적 파괴’ 주창해봐야…
나일론의 발명은 인류의 의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분명 혁신이다. 그것도 기술혁신이다. 그렇다면 샤넬(Gabrielle Chanel)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치마 밖으로 여성의 다리를 드러내는 스타일을 처음 만들고, 그를 통해 여성의 몸을 코르셋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혁신이 아닌가?
물론 기술혁신으로만 보게 되면 샤넬은 혁신가일 수 없다. 그러나 고객의 생활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샤넬은 혁신가의 자격을 얻게 된다.
분명 슘페터도 얘기했다. 기술혁신이란 단지 생산방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신상품, 신원료, 신시장, 신경영조직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이를 고객 중심의 시각으로 바꿔보면 혁신이란 ‘고객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는 모든 활동’이 된다.
‘소비자를 위한 계속적인 변화’, 이것이 혁신의 본래 의미다. ‘고객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요 ‘소비자를 위해 계속 변화하려는 자세’가 바로 혁신인 것이다.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완전한 무(無)에서 새로운 유(有)를 만드는 것만이 혁신이라고 우기지 말자. ‘고객입장의, 새로운 가치를 주려는 모든 변화’가 곧 혁신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 방향대로 변화’하는 것이다. 고객과 소비자가 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물론 기업의 선도적인 기술이 소비자의 새로운 니드를 만들기도 한다. 소비자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 못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휘어진 스마트폰이 나왔다. 새로운 기술이다. 소비자가 휘어진 스마트폰이 갖고 싶다고 했던가? 소비자의 사용상황을 관찰했더니 휘어진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는 변화의 방향을 읽었던 것인가? 둘 다 아니다.
고객지향적인 혁신의 사례로 맥심 커피믹스의 ‘이지 컷(Easy-cut, 낱개 포장을 가로로 쉽게 찢을 수 있도록 커팅 선을 낸 포장 방법)’을 꼽고 싶다. 21세기 대한민국 소비재마케팅에서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이지 컷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커피믹스를 사용하는 고객이 “커피 믹스를 뜯을 때 세로로 찢겨서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한 경우는 없었다. 그것 때문에 안 사먹겠다는 소비자도 없었다. ‘이지 컷’은 관찰의 산물이다. 작아 보일지라도 고객을 위한 변화 노력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애플 못지않은 다이소의 혁신
야노 히로타케(矢野博丈) 다이소산업(大創産業) 회장은 괴짜로 유명하다. 그렇다고 가볍게 봐선 안 된다. 그는 1987년 100엔숍을 창업해 일본에 2680개 매장을 비롯해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300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소는 100엔짜리 물건을 팔아 3000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성공신화를 써낸 기업이 됐다.

“‘가성비’가 브랜드를 압도한다”는 얘기를 장기 불황 시대의 트렌드라고 주장하는 성공의 이유는 간단하다. ‘고객을 위한 변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은 것이 그 이유다. 고객을 위한 끊임없는 변화? 바로 혁신이다. 혁신이 성공의 키였던 셈이다.
야노 회장은 “소비자 취향과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유통업의 기본”이라고 강조한다. 70엔에 물건을 들여와 100엔에 파는 대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품질이면 무조건 100엔에 맞춰 팔았다.
구매가격의 한계를 없애 때로 100엔에 사와 100엔에 판매하기도 했다. 야노 회장의 가격 결정 기준은 ‘원가’가 아닌 ‘고객’이었다. 그에게 있어 비즈니스의 키워드는 손님, 소비자, 고객이다.
‘고객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려는 끊임없는 노력’, ‘소비자를 위해 계속 변화하려는 자세’가 혁신의 시작이다. 다이소는 혁신으로 성공한 기업이다. 앱으로 치장하고 수수료 뜯는(?) 곳보다는 훨씬 더 고객지향의 혁신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