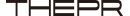[더피알=최영택] 지난달 기업에서 홍보 업무를 하던 후배 두 명이 회사를 그만두었다.
홍보임원으로 일했던 A는 광고분야 전문가로 홍보 전체를 관장하며 순조롭게 일해오다, 얼마 전 불거진 회사 고위층의 불미스러운 일이 사직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실추된 기업이미지에 대한 책임을 홍보담당임원에게 물은 것이다. 한 마디로 위기의 희생양이 된 셈이다.
또다른 이는 홍보부장으로 일했던 B다. 활달한 성격에 일도 시원시원하게 처리했고, 기자들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고 외부 홍보인들과의 관계도 좋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런 만큼 그의 사직을 안타까워하는 목소리가 개인 페이스북을 가득 메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의 말을 빌리자면, B 자신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다른 부서로의 발령과 성과에 대해 상사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점이 회사를 떠나게 된 이유인 듯하다.
물론 두 사람 다 실력과 경쟁력이 있으므로 조만간 다른 회사에서 자리를 잡겠지만, 회사 입장에서 보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홍보 테크닉, 그리고 로열티 등을 너무 쉽게 날려버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 홍보인의 경우엔 회장이나 CEO 등 최고경영자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 내 다른 일반부서가 직속상사가 부하들을 평가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기업의 대변인으로서 기업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보다 회장이나 CEO가 경영상 또는 개인적 잘못에 대한 부분에까지 홍보인에 책임을 지우는 일이 많은 까닭이다. 부정적 이슈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언론대응에 나서는 것은 물론, 요즘엔 SNS 등 온라인 진화도 홍보인의 몫이다.
홍보인, PR인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
이 질문은 학계에서도 자주 거론이 되는 논쟁거리인데, 적어도 국내 기업의 오너나 CEO들은 아직 홍보인을 전문가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생산공장이나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이를 홍보임원으로 앉히거나 기자 출신에 홍보 중책을 맡기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경영진의 이러한 인식이 홍보임원이나 팀장의 잦은 교체를 가져 온다. 반면 미국의 경우 PR인을 전문가로 존중하며, PR이란 업에 대한 프라이드도 상당하다.
디지털 시대를 맞아 온라인과 모바일로 홍보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PR산업도 성장했고, PR인들의 활동무대 또한 광고, 마케팅, SNS 분야를 아우른다.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이 홍보인들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확장된 플랫폼을 이용해 마케팅PR, 바이럴, 영상물 확산 등 업무영역을 넓히고 고객 소통창구를 종합 관리하는 기능도 갖게 됐다.
‘이제 모든 기업은 미디어 기업이다(Tom Foremski, 2009)’라는 명제가 시사하는 것처럼 기업이 자기 채널을 갖고 소비자, 임직원, 정부 등 이해관게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제일기획의 경우엔 소셜미디어 전략업무를 담당하는 최고디지털책임자(CDOㆍChief Digital Officer)를 운영하기도 한다.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홍보인들도 이제는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마케팅 경험을 쌓아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ㆍChief Communication Officer)를 넘어 최고디지털책임자의 역할도 하게 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아직도 언론에 목을 매고 홍보인에게 소방수 기능만을 요구하는 오너나 CEO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를….

최영택
The PR 발행인
동국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前 LG, 코오롱그룹 홍보담당 상무